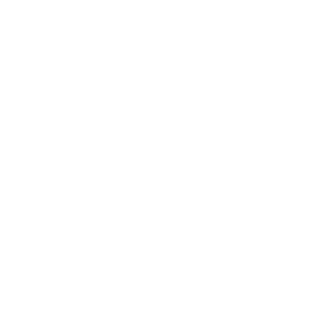수학으로 성공한 중국…수학에서 멀어지는 한국
미국 빅테크의 인공지능(AI)에 맞먹는 성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AI 딥시크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다는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딥시크는 다 수학입니다.” 딥시크의 원리를 설명한 논문도 “다 수학식으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수학이야말로 딥시크의 요체이자 본질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딥시크의 연구 인력 중에는 수학에 탁월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 교수는 “중국의 AI 전문가나 개발자 중에 절반은 수학자이고, 나머지 반은 소프트웨어를 짜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후자 역시 수학 실력이 뛰어나야 한다. 수학과 그 논리를 모르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잘 짠다는 건 불가능하다.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이 자신만의 업적을 쌓는 데에도 미적분이 핵심 역할을 했다.
AI뿐만이 아니다. 컴퓨터 세계를 바꿔놓을 양자 컴퓨팅도 그렇다. 김 교수는 오래전 양자 공부에 꽂힌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했다. 수학을 더 잘했다면 양자의 아름다운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미래에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고, 우리 삶을 근간부터 바꿀 AI와 양자 컴퓨팅을 한국이 잘하려면 수학 인재를 키워야 한다.
그러나 수학자들은 한국의 수학 교육이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도 2028학년도 수능에서부터 ‘심화수학’을 제외한 게 문제라고 한다. 기초 미적분(미적분I)은 수능에 들어갔지만, 심화 미적분(미적분II)과 기하는 빠졌다. 수능 과목도 아닌 심화수학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까 싶다. 특히 수능 점수만으로 신입생을 뽑는 정시 응시생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는 이공계 인재의 수학 실력을 떨어뜨리고 “수학이 전부”라는 AI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물론 교육부는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한다. 내신 선택 과목에 심화수학이 있다는 게 근거다. 대학은 내신 수학 성적과 학생부를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면 된다고 했다.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금은 내신과 수능에서 모두 심화수학을 공부·평가한다. 여기에서 수능이 빠지면 공부를 덜 하게 되는 건 필연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이공계 교수들은 신입생들 수학 실력이 예전보다 못하다고 불만이 대단하다. 2028년도 이후 고교 수학 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지면, 대학이 직접 학생의 수학 실력을 평가해 선발하겠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대학별로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학습 부담과 사교육 부담이 늘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심화수학을 수능에 포함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 대신 이공계가 목표인 학생은 수능에서 반드시 심화수학을 선택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지금의 문과 수준의 수학만으로 평가하면 어떨까 싶다. 그렇게 하면, 수학이 어려운 학생의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 이공계가 목표인 학생의 수학 실력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국 모델에 가깝다. 영국은 이공계 학과에 진학하려면 난도 높은 수학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인문계 학과가 목표라면 수학을 못 해도 옥스퍼드 같은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학 인재를 키우면서 ‘수포자’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시스템이다. 한국도 이 길이 옳지 않을까 싶다.
수학이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심화수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학습 부담을 줄인답시고 모든 학생에게 쉬운 수학 위주로 공부하라는 것도 옳지 않다. 수능에서 심화수학을 뺀 한국은 점점 후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수학의 후퇴, 나아가 미래 핵심 산업에서 국가의 후퇴를 낳을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